美·蘇 냉전은 유럽 아닌 제3세계에서 더 치열했다
by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입력 2020.05.30 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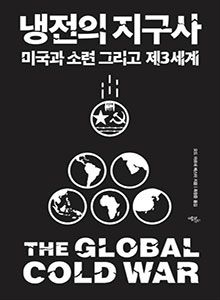
냉전의 지구사|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옥창준 옮김|에코리브르|814쪽|3만9500원
노르웨이 출신의 저자는 예일대에서 20세기 냉전(冷戰)의 역사에 대해 가르치는 역사학자다. 이 책에서 그는 유럽에 함몰되기 쉬운 냉전사에 대한 시야를 전 지구적 관점으로 확장시킨다. "기존 시각과 달리 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군사나 전략, 유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개 제3세계의 정치 사회적 발전과 관련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책의 원제도 '지구적 냉전(The Global Cold War)'이다.
과거 식민 지배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는 아시아·아프리카를 통칭하는 '제3세계'의 지역 연구와 냉전의 현대사를 결합시킨 학문적 야심이 돋보인다. 분단과 전쟁의 이중 비극을 겪은 우리에게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저자도 한국어판 서문에서 "지구적 차원의 냉전이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종식됐지만, 한반도인의 노력에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철 지난 종속 이론이나 낡은 반미(反美)적 시각에서는 "미국과 소련은 제3세계에서 자유나 사회 정의를 확장해 세계사의 자연적 방향과 자국의 안보를 일치시키고자 했다"는 서문의 구절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요컨대 선악의 이분법으로 미·소 양국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의 엘리트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두 강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냉전을 바라본다. "1980년대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특히 중국의 빠르고 성공적인 개혁·개방으로 인해 아시아뿐 아니라 제3세계 전역에서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퇴조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좋아요 0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